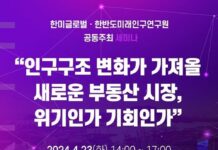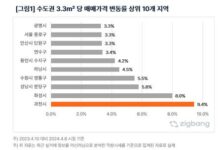버스업체가 시내·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놓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현행법상 저상버스 제공 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장애인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 사업자에게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해 장애인이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버스회사들이 즉시 모든 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시정을 위해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폭넓은 재량도 갖지만, 그런 적극적 조치 판결을 내릴 때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사익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차별행위를 고쳐야 할 피고의 재정 상태나 부담의 정도,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간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한 노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매립형 리프트를 모든 노선에 장착할 경우 고속버스업체는 383억원, 시내버스업체는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두 업체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원고 A씨 등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의무 이행 범위를 한정했다. 두 회사의 모든 노선에 즉시 휠체어 설비 설치를 명한 2심 판단과 비교하면 내용 면에서 일부 조정이 생긴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휠체어 탑승 설비와 달리 저상버스 제공은 현행 교통약자법 등을 볼 때 버스업체의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법령에 승·하차 편의를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규정만 있을 뿐 저상버스 도입 규정은 없고, 고속 구간이 많은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휠체어 탑승 설비 미제공에 국가와 지자체 책임도 있다고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애인단체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3월 시작돼 만 8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두 버스회사에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명령은 했지만 저상버스 설치 등 청구는 기각했다.
처음 소송을 냈을 당시 단체들은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이 17.5%에 불과하고 광역·시외버스 가운데는 한 대도 없다고 지적했었다.
8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이동권이 완전히 보장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저상버스 비중이 그나마 늘어난 시내버스는 2020년 기준 27.8%의 도입률을 나타냈지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힘들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에서도 저상버스 의무 도입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한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인 휠체어 탑승 설비·저상버스 제공 의무와 관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을 대법원이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