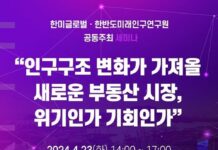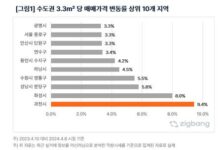우크라이나 국가(國歌)는 “우크라이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국가치고는 첫 소절부터 비극적이다. 하지만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각오도 엿보인다. 도대체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떤 일들을 겪어왔던 걸까.
하버드대 역사학과 석좌교수 세르히 플로히가 쓴 ‘유럽의 문 우크라이나'(한길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역사를 조명한 역사서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역사를 600쪽 넘는 분량으로 상세하게 담았다. 우크라이나 지역의 정치·경제·종교·문화적 상황은 물론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갈등 과정도 세밀하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책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풍요로운 지역이다. 넓은 곡창지대와 초원은 정주민과 기마민족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란계 스키타이인, 하자르족, 북유럽 지역의 바이킹, 슬라브족, 몽골인, 튀르크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이 지역을 다스렸다. 다양한 문화가 싹틀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저자는 “우크라이나 문화는 항상 다른 문화와 공유된 공간에 존재했고, 초기부터 ‘타자들'(Others) 사이를 헤쳐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한다.
주로 유목민들이 오고 갔지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인들의 조상인 동슬라브족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정착했다. 그러나 8세기 후반부터 ‘루스 바이킹’이라 불리는 노르만인들이 키이우를 점령하면서 나라의 토대가 마련됐다. 키이우 공국의 군주 스뱌토슬라우, 볼로드미르, 야로슬라우는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이고, 문자를 확립하면서 키이우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그러나 야로슬라우 죽음 이후 잦은 권력투쟁과 외부 침입으로 쇠약해지다가 13세기 중반 몽골제국에 병합됐다. 몽골의 지배가 끝난 후에도 완전한 독립 국가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한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대공국에 통합됐고, 점차 힘을 키워가던 모스크바 공국의 영향 아래 놓이기도 했다. 16~17세기에는 상당수 국민이 노예로 팔려 가는 수모를 겪었다. 크림반도 노예시장에 끌려온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은 150만~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경비병·자유인·약탈자라는 의미를 지닌 코자크(코사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코자크들은 폴란드 왕국, 모스크바 공국, 스웨덴 왕국, 오스만튀르크 제국 등 주변 강국과의 합종연횡을 통해 독립을 꿈꿨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건 힘없는 국가의 뼈저린 현실이었다. 결국 강대국에 이용만 당하다 18세기 무렵, 제국으로 도약한 러시아에 병합됐다.
러시아에 복속된 후 우크라이나 지역은 소련이 붕괴한 20세기 후반까지 러시아의 강력한 자장 안에 있었다. 러시아는 끊임없이 동화정책을 폈다. 19세기 후반에는 우크라이나 언어로 된 책 출간이 금지됐고, 우크라이나어로 된 연극과 노래 공연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제 정치가 발달한 러시아에 견줘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가 강한 우크라이나는 민족·언어적인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했다. 그들의 시선은 늘 서방을 향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와 문화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아이디어는 19세기 사상가 미하일로 드라호마노프부터 1920년대 민족 공산주의 주창자였던 미콜라 흐빌료비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 지식인들을 사로잡은 생각이었다.”
결국 기회가 찾아왔다. 소련 해체 후 독립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서방을 노크했다. 절박했던 만큼 우크라이나는 핵심 안보 수단이었던 핵무기마저 포기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세계 3위의 핵전력을 보유했는데, 1994년 12월 안보 보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미국·영국·러시아 등과 체결했다. 저자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주권 행사는 유럽 국가 공동체에 가입하려는 열망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