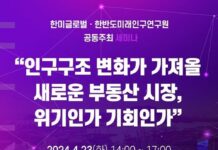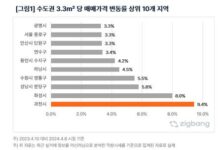올해 국립오페라단은 국내 초연작 두 편을 무대에 올린다. 둘 다 유럽에서도 자주 공연되지 않는 베르디의 역사극이다. 한 해 공연 프로그램 안에 바로크 오페라도 현대 서양 오페라도 포함돼 있지 않고, 레퍼토리가 이탈리아 오페라에 편중된 것은 국립오페라단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7일 저녁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그 첫 작품인 ‘아틸라’가 막을 올렸다. 1846년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한 이 작품은 베르디의 ‘리소르지멘토(이탈리아 통일운동) 오페라’ 가운데 하나다.
작품은 당시 북부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합스부르크가의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하려는 이탈리아인들의 열망을 반영했다. 이 오페라에서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 군대는 오스트리아, 침략을 당해 고통 받는 이탈리아인들은 바로 베르디 당대의 북부 이탈리아인들을 각각 상징했다. 게르만 신화의 주신(主神)인 보탄(Wotan)이 훈족의 신으로 둔갑해 합창에 종종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아틸라’는 ‘리골레토’나 ‘라 트라비아타’만큼 극적 구성이 치밀하지는 않다. 가슴을 울리는 깊은 감동의 아리아도 드물다. 베르디 당대 이탈리아 관객들은 자신들이 처한 정치 상황 때문에 벅찬 감동을 느꼈겠지만, 훈족을 야만족, 로마를 포함한 이탈리아인들을 문명인으로 구분하는 서구 중심의 설정에 현대의 한국 관객들이 공감할 이유도 없다.
무너져가는 로마제국을 침략하는 훈족의 왕 아틸라, 그와 협상을 시도하는 로마 장군 에치오, 침략당한 아퀼레이아의 공주인 이탈리아 여성 오다벨라, 오다벨라의 연인이자 독립투사인 포레스토 등 네 주역은 모두 내면에 갈등과 두려움을 지닌 인물들이다. 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이 그리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초연은 성공적인 편이었고 그 공은 성악진의 탁월한 역량 덕분이다.
오다벨라 역의 소프라노 임세경은 극 초반부터 음의 폭이 크고 고난도 테크닉이 필요한 아리아 ‘조국을 향한 거룩하고 무한한 사랑’을 넘치는 파워와 유연한 레가토(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는 기법)로 노래해 길고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포레스토 역의 테너 신상근은 연인 오다벨라의 배신을 의심하는 괴로운 심경을 탁월하게 연기하며 명징한 발성과 깊이 있는 표현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임세경과 신상근이 함께 노래할 때면 관객들은 감탄과 몰입에 빠져들었다.
로마 장군 에치오 역을 노래한 바리톤 유동직은 기품있고 정제된 가창으로 야심만만하면서도 진지하게 고뇌하는 인간형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타이틀롤을 맡은 베이스 전승현은 무대 깊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많아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정적인 가창으로 아틸라의 거칠고 담대한 풍모를 잘 살렸으나 인물의 섬세한 불안이나 사색적인 면을 표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합창의 비중이 큰 이번 작품에서 국립합창단은 탄탄한 기량을 과시하며 극의 활력과 생동감을 책임졌다. 이탈리아 지휘자 발레리오 갈리가 이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특히 합창과 함께 하는 부분에서 박력과 세심함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다만 합창단이나 성악진과의 호흡 면에서, 연습이 충분하지 못했으리라는 추측을 낳는 부분도 있었다.’
연출가 잔카를로 델 모나코는 지붕이 잘린 석조건물, 바닥에 뒹구는 기둥들, 목이 잘린 대리석상 등을 무대에 배치해 쇠락해가는 로마제국의 이미지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
훈족 군대와 로마군의 특징을 뚜렷하게 대비시킨 의상과 가면, 분장 등도 관객의 이해를 도왔다. 아틸라의 막사를 상징하는 거대한 회색 천이 무대 위를 덮는 장면, 탄식의 아리아를 부르는 에치오 뒤에 로마를 상징하는 붉은 천을 사용한 장면 등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영상을 사용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다를 보여주거나 번개가 칠 때 병사들이 그쪽을 향해 일제히 창을 들어 올리는 장면 등은 효과적인 디테일이었다.
다만 내용 전달과 극적인 효과에만 집중했을 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관객이 이 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