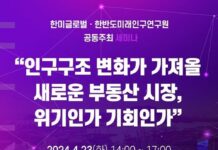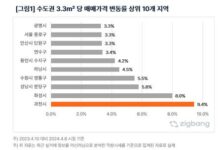법원의 실수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불복·시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주식회사 B사의 미등기 부동산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듬해 4월 B사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A씨에게 본안 소송 제기를 명령해달라’며 제소 명령을 신청했다. 하루빨리 본안 소송으로 가압류의 정당성을 판단 받으려는 취지였다.
법원은 그해 5월 7일 ‘A씨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
A씨가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것은 2014년 5월 12일이다. 그는 6월 2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
날짜수로 계산하면 A씨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송달 21일 뒤였으므로 B사는 ‘A씨가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고심은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착오했다”며 다시 A씨 손을 들어줬다. 민법 161조는 기간을 정할 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에 만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4년 6월 1일은 일요일이므로 본안 소송 제기 마지막 날은 6월 2일이 맞는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의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받았으나 부동산의 소유권은 제3자로 바뀐 뒤였다.
애초 이 부동산 강제경매에 참여해 배당을 받으려던 A씨는 가압류 말소로 인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예상 배당액인 7억8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즉시 항고’만 하고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만큼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재판부의 잘못이 직무수행상 통상의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가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돌렸다. A씨가 즉시 항고를 한 이상 충분히 효력 정지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